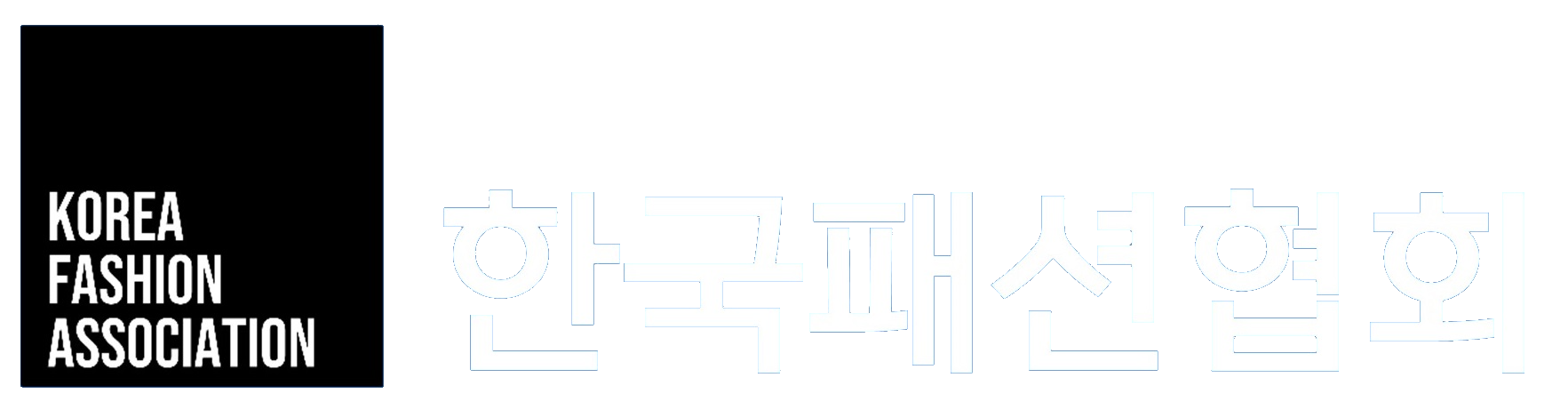기회가 될 때마다 ‘친환경 소재(eco-friendly material)’보다는 ‘지속가능한 소재 (sustainable material)’라는 표현을 써보자고 얘기해도 ‘친환경’ 이라는 표현이 일반적으로 익숙하다는 상대의 답변에 그냥 해 본 얘기가 되기 일쑤이다.
개인의 경험과 생각 그리고 정보의 차이에서 오는 인식의 차이 때문일 것이다.
‘지속가능성’ ‘리사이클소재’ ‘기후변화’ ‘net-zero’ ‘투명성’ ‘화학물질관리’ ‘social labor’ ‘생분해’ ‘컴플라이언스’ ‘바이오기반’ ‘탄소중립’ ‘ESG’ ‘Higg’ ‘SBTi’ ‘공급망 매핑’ 등 5년 전쯤 그 당시 섬유패션업계에 존재하지 않았거나 주목받지 않던 생소한 단어와 용어들이 이제 글로벌 섬유패션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동시에 이런 ‘용어’나 ‘표현’에 대한 서로 간의 이해의 간격은 오히려 더 커진 느낌이 든다.
내가 원하는 것만 알리고 싶어
섬유업계에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기 상품의 점점 높은 수준의 품질과 특징을 어필하는 데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용어’들은 마케팅을 통한 차별화에 활용된다.
반면 상품의 가치나 상품성에 비해 과도한 품질이나 기능은 자원의 낭비와 불필요한 소비를 부추기기도 한다.
최근 ‘친환경적인’ 소재로서 폐PET병 재활용 섬유가 크게 주목받았다.
온실가스 배출과 원료 투입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였지만, 이미 폐PET병을 제조를 위한 폴리에스터 원료 생산과정에서 온실가스는 배출되었으므로, 절대적 기준에서는 그냥 버려질 PET을 재자원화했다는 효과만 남게 된다.
[출처 : 패션포스트]
(더 많은 정보를 읽으시려면 바로가기를 클릭해주세요)